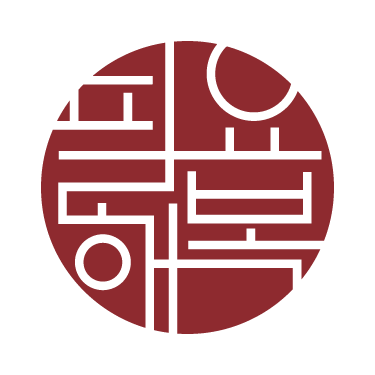티스토리 뷰
마포나루다. 정씨 아저씨가 보인다.
“아저씨!”
초희가 반가운 얼굴로 아저씨에게로 달려갔다.
“아이쿠! 초희가 웬일이냐?”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근처 주막에 방을 잡고 초희는 아저씨와 마주 앉았다.
“이 책들을 아저씨가 맡아주셨으면 해요.”
초희는 보자기에 싸인 책을 건넸다.
“아니, 이건 너희들이 쓴 책이 아니냐?”
초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대체 이걸 왜? 이걸로 약의 형태도 바꾸고 널리널리 퍼트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초희가 머쓱하게 웃었다.
“그랬지요. 아무래도 저희는 다시 이대로 못 쓰려나 봅니다.”
“아니 왜?”
“다른 의관들이 좋아하질 않네요.”
정씨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나무 상자가 셋이었다.
“지난번에 부탁한 약이야. 너무 늦었다. 우선 갈근탕, 소시호탕, 백호탕만 만들었다. 한 달 전에 만든 건데도 효과가 아주 좋아. 내가 그제 찬바람을 쐬고 오한이 나서 죽겠더니 갈근탕 한 숟가락 퍼먹고 바로 말짱해졌다. 하하하. 갈근탕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먹는지 몰랐어.”
초희도 웃었다.
“이 책, 잘 보관해 주셔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씨는 옛날부터 노인에게 약재를 댄 약재상이다.
집으로 돌아온 초희는 견이 광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아니, 어떻게…….”
“스승님이 이제 잠잠해졌다 하셨어.”
초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에게 책을 가져다 드렸어. 이제 그냥 기존 의서대로 탕약으로 하자.”
견이 고개를 저었다.
“그대로 써.”
“무슨 말이야? 그럼 아저씨에게 책은 왜 주라고 한 거야? 이제 다 버리고 기존 규율대로 환자를 치료할 목적이 아니었어?”
“아니야. 언제 내의원 사람들이 닥칠지 몰라 그리한 거야.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우린 원래 했던 생각 그것만 지키면 돼. 가난한 백성도 쉽게 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의서 내용을 쉽게 쓰는 것, 그래서 의학이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 의학은 누군가의 비법으로 남아서는 안 돼.”
초희는 걱정은 되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도 환자에게 환산제 약을 처방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다 말씀하세요.”
내금위 병사의 아내였다.
“요즘 소화가 계속 안 되는 것이 무엇만 먹어도 체합니다. 집에 상비해둔 소화제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견은 진맥을 하고 혀를 살피고 명치를 눌러보았다.
“갑자기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까?”
여인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말도 마십시오. 우리 집 영감이 요즘 갑자기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게 그렇게 입맛이 좋던 제가 갑자기 이럽니다요.”
여인이 민망한 듯 피식 웃는다.
“제가 우리 영감이 어머니께 드리라는 돈을 빼돌리다 걸렸거든요.”
견도 같이 웃어보였다.
“이것은 신경성으로 위장 경직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소화제를 먹어도 안 듣지요. 소화제는 위장 안에 음식물만 부셔내어 과식이나 소화불량에는 들으나 신경성으로 온 위 경직에는 잘 안 듣습니다. 몸에서 간은 흘러가는 일을 합니다. 그 기능을 못하면 위가 경직이 잘 되지요. 게다가 간화(肝火)도 생겨 그 열이 올라가면 머리로 혈관이 확장되어 압이 생기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부인이 박수를 크게 한번 쳤다.
“맞습니다요. 요즘 뒷골도 이상하게 아픕니다. 나리는 말씀도 참 저희가 쏙쏙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셔서 설명만 듣고 있어도 병이 낫는 것 같습니다요.”
“이때는 간을 흘려보내는, 한마디로 격을 뚫는 대시호탕과 소화를 시키는 향사평위산, 상초 열을 내리기도 하고 아래로 내리는 힘도 있는 삼황사심탕을 씁니다. 약방문(藥方文)을 써드릴 테니 옆에 저기 가서 약을 타 가십시오.”
초희가 옆에서 약방문을 보고 약을 내어주었다. 작은 나무통 세 개에 각각의 약을 하나씩 담아주었다.
“한 숟갈씩, 공복에, 하루 세 번씩 드시면 됩니다. 다음에 약을 지으러 오실 때 통을 가지고 오시면 통 값은 빼드릴게요.”
오늘도 많은 환자를 보고 저녁을 먹으려는데 낮에 본 내금위 병사의 아내가 달려왔다.
“나 여기 약 좀 다시 가득 담아줘.”
“네? 낮에 가져가신 약이 닷새 치는 되었는데요.”
여인이 잇몸을 보이며 크게 웃었다.
“내가 그걸 한번 먹자마자 답답한 게 싹 사라져서 동네방네 다 퍼주고 다녀버렸어. 동네 여편네들이 다 체기가 있었는데 그걸 소화제만 먹고 있었으니 됐겠는가? 여편네들이 아픈 이유가 뭐겠는가? 참고참고 또 참다 병이 오는 게지.”
“다행이네요.”
초희가 웃으며 약을 담아줬다.
“이 약은 안 달여 먹어도 돼서 좋아. 입에 털어 넣고 물만 꿀떡 마시면 되잖아. 약재 가져가면 누가 달이나? 여자들이 옆에 붙어서 졸여질까 종일 지켜서 있어야 하고 말이야.”
동네방네 소화제로 다스려지지 않는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탕약으로 달여 먹기도 힘든데 한 숟가락 퍼먹으니 나아버렸다는 말이 퍼졌다.
“나는 가만있는데도 머리로 땀이 쏟아지오.”
내의원 판관의 동생이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년 됐소.”
견은 하나하나 살폈다.
“헌데 판관 나리께서 제게 오신 것을 아시면 가만있지 않으실 텐데요.”
판관의 동생은 심술 난 표정을 지었다.
“그러라지. 내의원 형님을 두면 뭘 합니까? 백날 약을 달여 먹어봐도 낫질 않는데.”
“약방문을 써드릴 테니 약은 받아가시되 형님 몰래 드십시오. 들키면 제가 곤란합니다. 이 병은 한 달은 먹어야 나으실 겁니다.”
견은 웃으며 말했지만 걱정이 되었다. 그렇다한들 찾아온 병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다.
판관 동생은 <육미지황환, 쌍화탕, 황련해독탕, 소시호탕>이 적힌 약방문을 초희에게 내밀었다.
“머리로 땀이 나시나 보네요.”
초희가 약방문을 보고 말했다.
“약방문만 보고도 내 병을 아시겠소?”
“그럼요. 이는 쌍화탕은 황한지병(黃汗之病)에 쓰는 약인데 육미를 보니 오래된 병일 테고, 소시호탕을 보니 상초에서 병이겠지요. 황련해독탕은 열에 의한 병일 테구요.”
“허허허, 내 형님에게 의학용어를 가끔 듣기는 했으나 약화제만 보고도 병을 맞추니 놀랍구려.”
다음날은 식한(음식만 먹으면 땀이 남), 두한출(머리로 땀이 줄줄 흐름), 수족한(손바닥 발바닥에 땀)……. 땀이란 땀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잘 되어도 걱정이야. 다른 의원들이 시기하면 어떡할까 말이야.”
초희가 걱정을 하였다.
“그리 되어라고 하는 거야.”
견은 단호했다.
'한약 이써 > 신인류의 한방-소설로 풀어본 한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6년, 견의 술집>-신인류의 한방 8 (0) | 2016.09.29 |
|---|---|
| <견의 꿈>- 신인류의 한방 7 (0) | 2016.09.29 |
| <2016년, 견의 술집>- 신인류의 한방 5 (0) | 2016.09.29 |
| <견의 꿈, 선조 23년>- 신인류의 한방 4 (0) | 2016.09.29 |
| <2016년, 견의 술집>- 신인류의 한방 3 (0) | 2016.09.29 |
- Total
- Today
- Yesterday
- 한약 소설
- 한약사
- 한방제제
- #유방암증상 #유방암의증상 #유방암생존율 #초기유방암 #유방암4기 #유방암발생원인 #유방암 검사 #삼중음성유방암 #유방암 수술 #유방암 2기 #유방암 전이 #유방암 1기 #유방암 카페 #유방암 치
- 한약제제
- 한방의 과학화
- 10년후 한방
- #지방간에 좋은음식 #간경화에 좋은 음식 #강아지 간에 좋은 음식 #간수치에 좋은 음식 #위에 좋은 음식 #간에 좋은 영양제 #간암에 좋은 음식 #간에 좋은 즙 #간에 좋은 음료 #간에 좋은 약 #간에
- #권리금 계약서 양식 #상가권리금계약서 #권리금양도양수계약서 #권리금 수수료 #권리금 계약금 #상가권리금 계약서 #학원 권리금계약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시설 권리금 계약서 #표준 권리금
- #췌장암 초기증상 #췌장암 증상 #췌장암 검사 #췌장암 등통증 위치 #췌장암 원인 #하알라 췌장암 #췌장암 완치율 #췌장암 4기 #췌장암 등통증 #췌장암 변 사진 #췌장암3기 #췌장암 수술 #췌장암 통
- #위암 증상 #위암 4기 #위암 초기 #위암 원인 #20대 위암 #위암 생존율 #위암 수술 #위암 사망률 #위암초기증상 #위암1기 #위암3기 #위암2기 #초기 위암 증상 #위암 수술 후 식사 #위암 4기 생존율 #위
- #간암 증상 #간암 생존율 #간암 말기 #간암 원인 #간암 명의 #간암 수술 #간암 초기 #간암 치료 #간암4기 #간암2기 #간암 색전술 #간암 검사 #간암 복수 #간암에 좋은 음식 #간암말기증상 #간암수치 #
- 과립제
- 한방 소설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대출 후기 #소액생계비대출 부결 #소액생계비대출 입금 #긴급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대출 추가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 서
- #갑상선암 증상 #갑상선암 좋은 음식 #갑상선암 수술 #갑상선암 수술후 #갑상선암 원인 #갑상선암 전이 #갑상선암 사망 #갑상선암 수술비용 #갑상선암 재발 #갑상선암 수술후 음식 #갑상선암 로
- 한약 과립 녹이기
- 한약 과립제
- #신장암 증상 #신장암 1기 #신장암에 좋은 음식 #신장암 수술 #신장암 명의 #신장암 4기 #신장암 로봇수술 #신장암 3기 #신장암 전이 #신장암 생존율 #신장암 원인 #신장암 초기증상 #신장암 폐전이
- 신인류의 한방
- #신장의 기능 #간의 기능 [AMC 병법] #간의 기능 콩팥과의 비교 #간의 기능과 간성혼수 #간의 기능과 간이식 #간의 기능과 관련 질병 #간의 기능과 역할 #간의 기능과 황달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 #전립선암 증상 #전립선암 생존율 #전립선암 수술 #전립선암 음식 #전립선암 4기 #전립선암 수치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전립선암 카페 #전립선암 3기 #전립선암 명의 #전립선암 검사 #전립선암 2
-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재도전특별자금(2023년중소벤처기업부소관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계획변경공고)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2023년중소벤처기업부소관소상공
- 한약 과립
- #담낭암 증상 #담낭암 기본정보 #담낭암 생존율 #담낭암 4기 #담낭암 원인 #담낭암 명의 #담낭암 3기 #담낭암 말기 #담낭암 수술 #담낭암 2기 #담낭암 치료 #담낭암과 담관암 또는 담도암은 어떻게
- 사람을 향하는 한방
- 한약국
- 과립제 먹는법
- #폐암 초기증상 #폐암 4기 생존율 #폐암 4기 #폐암 검사 #폐암 생존율 #폐암 수술 #폐암 항암치료 #폐암 치료 #폐암 치료제 #폐암 방사선치료 #폐암 신약 #폐암 완치 #폐암 병기 #폐암 약 #폐암에 좋
- 한약과립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